빌헬름 가이거(Wilhelm Geiger)의 팔리어 문법서는 1916년에 독일어로 초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영어번역본 개정판, 「A Pāli Grammar」(Pali Text Society 1994)를 구해놓고 읽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음운론 부분을 먼저 읽어보았다. 빈틈없이 정교하게 수놓은 장인의 솜씨가 느껴진다. 작은 공간에 각 용례마다 출전을 밝힌 작업내용을 작품을 감상하듯 감상하자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요즘처럼 전자검색이 불가능한 20세기 초에 이렇게 문법 용례의 출전을 밝히자면 경론을 전수 독해하며 별도의 노트작업을 해야 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선학의 사전작업이나 문법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으니, 그 정성과 수고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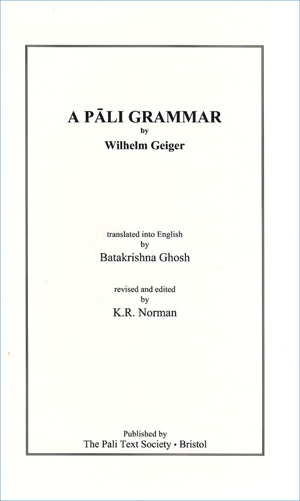
빌헬름 가이거의 팔리어 문법서. 영어번역 개정판이다. 마치 장인의 위대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이다.
빌헬름 가이거는 1916년에 「Pāli Literatur und Sprache」(Trübner)를 출간했다. (독일어 초판은 괴팅엔 대학에서 책갈피가 있는 PDF파일로 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타크리슈나 고슈(Batakrishna Ghosh)가 영어로 번역한 것이 「Pāli Literatur and Language」(University of Calcutta 1943)이다. 노먼(K.R. Norman)이 작업한 「A Pāli Grammar」(Pali Text Society 1994)는 고슈의 번역판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판 출간 취지에 대해서는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팔리성전협회는 수년 동안 팔리 문법서를 출간목록에 넣고자 하였으나, 누구에게도 적절한 분량과 깊이의 문법서를 저술하도록 독려하지 못했다. 기존 문법서 중에는 초학자와 팔리어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책이 없었다. 그중에서 가이거의 「Pāli Literatur und Sprache」(영어 번역은 「Pāli Literatur and Language」)가 학계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책으로 보이지만, 초학자는 방대한 출전과 조밀하게 편집된 내용 탓에 버겁게 느낄 것이다. 결국 가급적 두 층의 사용자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가이거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 「A Pāli Grammar」, 머리말에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가이거의 팔리어 문법서가 개정되고 개편되었다. 먼저 가이거 초판의 “팔리 문헌(Pali Literatur)” 대목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노먼의 간략한 팔리어 소개를 서문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가독성이 좋도록 문단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으며, 가이거 당시에는 사전의 부재로 인해 방대한 출전이 필요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었으므로 개정판에서는 출전을 대폭 줄였다. 이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과연 개정판을 보니 초판이 가진 난해하고 복잡한 인상이 없어지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정성을 들여 읽고 싶은 책으로 다가온다. 더불어 빌헬름 가이거의 학문적 열정과 정성을 추념하자면 이 책의 귀함은 독보적이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나는 존경의 념을 품고서 이 책을 공부할 것이다.
그러면 빌헬름 가이거의 경론 번역서는 없을까? 문득 궁금함이 일어 살펴보니, 「상윳타니카야」 독일어 번역판이 있다. 아, 수년 전에 구입해 놓고도 칼 노이만의 번역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제 보니, 칼 노이만은 「디가니까야」, 「맛지마니카야」까지 번역하고 작고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 빌헬름 가이어가 「상윳타니카야」를 번역했다. 그러나 빌헬름 가이거마저 마무리짓지 못하고 작고하자, 다시 그 뒤를 이어서 냐나포니카 스님이, 또 다시 그 뒤를 이어서 헬무트 헥커가 번역에 동참해서 마침내 「상윳타니카야」 독일어 번역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상윳타니카야」(Beyerlein-Stenischulte 2003)의 독일어판 역자는 세 분이다. 책은 단권이지만 서체와 조판이 역자별로 다르다. 이런 경우의 책은 처음 접했지만, 독일의 경전번역사를 학술적 유산으로 간직하며 선학의 작업을 소중히 다루는 독일 출판사의 자세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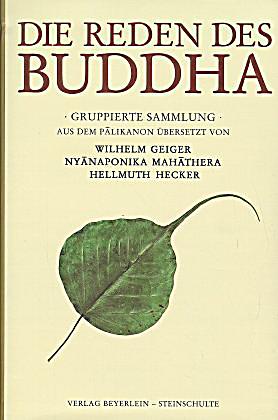
「상윳타니카야」 독일어 번역. 단권이지만 번역자가 셋이다. 번역자별로 서체와 조판이 달라 역사적 유물을 대하는 기분이다.
「상윳타니카야」의 첫 경, “폭류경”의 독일어 번역을 검토해 보았다. 이 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appatiṭṭhaṃkhvāhaṃ, āvuso, anāyūhaṃ oghamatari”이다. 이 경문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그는 “나는 가만히 있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폭류를 건넜다”(Ohne Halt und ohne Kampf hab’ ich die Flut überschritten)로 번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붓다는 수수께끼 형식으로 말한다”고 평했다.
그렇다. 이 경문을 읽고서 일반 논리칙으로 소화된다면 이는 잘못 읽은 것이다. 이 경문을 제대로 읽자면 논리칙에 반하는 “수수께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팔리 경전과 수행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냐나난다 스님이 이 경문을 “벗이여, 나는 지체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폭류를 건넜다”(without tarrying, friend, and without hurrying did I cross the flood)로 옮긴 것은 의외였다. 이 번역문은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처지지도 말고 적절하게 움직여 건너라는 의미로 읽힌다. 과연 중도가 그런 의미일까? 이는 경문의 깊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번역이 낫다는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경문 하나하나가 일반 논리칙을 파괴하는 깊은 오의를 품고 있으므로, 늘 면밀하게 살펴서 읽고 번역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만큼 경전은 깊고도 깊은 세계이며, 그 세계에 진입하는 번역자의 자세는 경전에 값하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깊고도 깊음(甚深)”의 원어는 gambhīra로, 이는 호수의 깊음을 말한다. 맑은 호수의 물을 보면 투명하여 깊은 바닥까지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 바닥이 훤히 보이니까 그다지 깊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누구나 헤엄칠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속으로 들어가보면 그 깊이에 소스라치게 놀라 두려워하게 된다. 경전의 깊이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 깊이를 체득하지 못한 채 경전에서 호기롭게 헤엄치는 자, 논리의 착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말한다, “나는 너에게 바닷물이 깊고도 깊다고 타일렀으나 너는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오직 나만이 대해의 바닷물에서 씻고 목욕할 수 있으며, 너는 씻고자 하여도 씻을 수 없느니라.”(「증일아함경」 권46)
빌헬름의 가이거라는 장인의 작품을 읽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전의 대해와도 같은 깊이를 들여다본다. 사람은 쉬이 늙고 배울 것은 어찌 이리도 많은지!